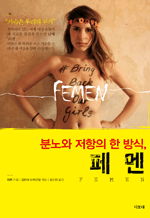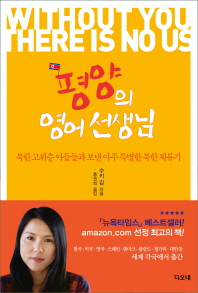바람이 내 등을 떠미네 - 아픈 청춘과 여전히 청춘인 중년에게
- 저자
- 한기봉
- 출판사
- 디오네
- 출판일
- 2021-10-22
- 등록일
- 2021-11-25
- 파일포맷
- COMIC
- 파일크기
- 1KB
- 공급사
- 우리전자책
- 지원기기
- PC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책소개
아픈 청춘과 슬픈 중년에게 전하는 공감과 위로
책은 저자가 천착하는 주제에 따라 다섯 개의 장으로 나뉜다.
1장은 〈삶에 수작 걸다〉라는 제목에 걸맞게 독자에게 술 한 잔 건네듯 은근히 다가가는 장이다. 예사롭게 여겼던 것에 살며시 딴지 놓으며 낯설게 환기하고, 더러는 불편할 수 있는 무거운 주제를 자연스럽게 풀어놓으며 흥미를 끌어당긴다.
2장의 〈아픈 청춘, 아직도 청춘〉에서는 청춘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담았다. 이 시대의 아픈 청춘에게 건네는 위로 속에 쓴소리를 양념처럼 풀었다. 하지만 아직도 마음속에 살아 숨 쉬는 자신의 청춘을 떠올리며 써 내려갔기에 진득한 애정이 담겼다. 청춘을 지났어도 여전히 마음은 늙지 않아 슬픈 이 시대 중년과도 진솔하게 공감한다.
3장 〈불현듯, 새삼스럽게〉에서는 살아오며 느끼고 문득 깨달은 것을 털어놓는다. 대체로 쓸쓸했던 날에 찾아온 순간의 반짝이는 성찰, 무언가에 설레고 열광했던 한때, 삶과 죽음에 대한 각성, 우연히 본 기사, 운명처럼 조우한 한 줄의 시, 보도블록 틈새에서 마주친 제비꽃처럼, 그 순간들은 매우 사소하지만 메시지는 새삼스럽다.
4장의 제목은 조지훈의 시 「낙화」에서 영감을 얻은 〈꽃이 지기로서니 바람을 탓하랴〉이다. 멈출 수 없는 시간의 흐름과 사라지거나 스러지는 것에 대한 연민을 담담이 풀어놓는다. 인생의 봄날은 지났지만 정신은 여전히 수선한 중년의 마음이 애잔하다. 저자가 좋아했던 영화의 대사와 노랫말과 시를 함께 보는 즐거움도 있다.
마지막 5장인 〈혼자는 외롭고 둘은 그립다〉에서는 중년의 나이에 맞닥뜨리는 아주 솔직하면서도 절실한 감정을 엿볼 수 있다. 팬데믹이라는 전대미문의 상황과 삶의 전환점에서 맞이한 어쩔 수 없는 변화, 그래서 어느 때보다 절실한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이야기한다. 슬픔을 품은 담담한 어조는 읽는 이에게 차분한 위안을 전한다.
보통의 일상에서 건져 올린 특별한 각성
책에는 「노벰버 엘레지」라는 제목의 글이 있는데,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11월’에 관한 단상을 이야기한다. 저자의 말에 따르면 11월은 1년 중 가장 푸대접을 받는 달이라고 한다. 앞에 붙은 10월처럼 들뜨거나 화려하지도 못하고 뒤에 이어지는 12월처럼 부산하거나 유의미하지도 않은, 그래서 징검다리 같은 통과의례적 달이라고 한다. 11월이 정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많은 날은 11월과 같지 않을까? 화려하고 유의미한 날보다는 대수롭지 않고 기억에 남지 않는 날이 일상다반사다. 저자가 11월을 견디는 것처럼 많은 날을 그렇게 살아 내야 한다.
하지만 저자는 그런 11월의 늦은 저녁을 좋아한다고 했다. 서늘하고 쓸쓸하게 견뎌야 하는 11월은 어쩌면 다가오는 날에 대한 기대가 가장 커지는 달인지도 모른다. 해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얘기처럼. 어찌 되었든 세월은 우리를 계속해서 떠밀어 어딘가로 나아가게 한다. 마치 11월의 쓸쓸한 바람이 등을 떠미는 것처럼 말이다.
흔히 말하는 드라마틱한 인생은 이 책에 없다. 하지만 보통 사람의 삶도 세세히 들여다보면 저마다 각자의 지난한 스토리텔링을 갖고 있다. 그렇기에 하나로 정의하거나 정리할 수 없는 무수한 삶의 순간과 변화무쌍한 감정을 담은 이 책은 우리 인생의 축소판 문집이기도 하다. 저자는 말한다. 어쨌든 살아 내야 한다고. 제비꽃은 제비꽃대로 피면 되고 진달래는 진달래답게 피면 된다고. 눈이 오면 눈길을 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가면 된다고. 정직한 절망이 희망의 시작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