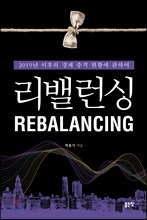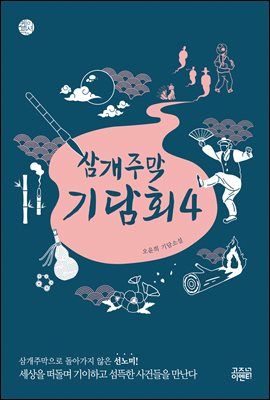엄마가 남기고 간 것
- 저자
- 오윤희
- 출판사
- 좋은땅
- 출판일
- 2021-07-14
- 등록일
- 2021-11-25
- 파일포맷
- COMIC
- 파일크기
- 1KB
- 공급사
- 우리전자책
- 지원기기
- PC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책소개
엄마를 묻은 날은 부슬부슬 엷은 비가 내렸다. 땅 속까지 흠뻑 스며들지 않는, 사물을 슬쩍 스치고 지나갔다가 그대로 투명하게 사라지고 마는 듯한 존재감이 옅은 비였다. 그 보슬비가 엄마의 관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다가 미미한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공기 중으로 사라지는 걸 바라보면서 비가 엄마와 닮았다고 생각했다. 어린 시절 살았던 시애틀 포트 루이스와 텍사스 킬린에서 아시안 여성은 보기 드문 존재였다. 사람들의 시선은 엄마의 검은 머리와 동양인 특유의 선이 가는 얼굴 윤곽에 다른 이들을 볼 때보다 몇 초 정도 더 오래 머물곤 했다. 그럴 때마다 엄마는 자신의 발치를 바라보며 묵묵히 그 시선을 견뎠다. 하지만 단순한 호기심이든 어떻든 간에 엄마가 타인의 관심을 끄는 것은 처음 한 번뿐이었다. 엄마의 어눌한 영어와 말할 때마다 스스로가 외국인임을 여실히 드러내는 강한 억양을 접한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엄마를 향한 관심을 접었다. 엄마의 존재감은 아주 빠른 순간만 반짝였다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짧은 순간 투명하게 반짝이다가 그대로 증발하고 마는 저 빗방울들처럼.
때로는 엄마가 일부러 자신의 존재감을 지우려 한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었다. 누군가 엄마에게 말을 걸려고 하면 그렇지 않아도 왜소한 엄마의 몸은 갑자기 더 작아지는 것처럼 보였다. “한국에서 왔다고요? 그럼 고향은 어디에요?” “아…저…. 남쪽 도시인데…아마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미국 생활은 어떠세요?” “…좋아요.” “어떤 점이요?” “미국은 잘사는 나라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