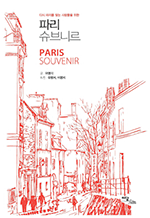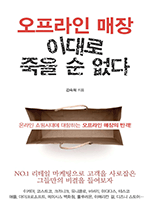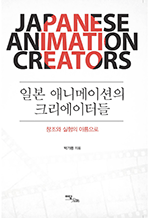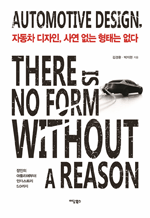
자동차 디자인, 사연 없는 형태는 없다 - 장인의 아틀리에부터 인더스트리 5.0까지
- 저자
- 김경환
- 출판사
- 이담북스
- 출판일
- 2022-01-13
- 등록일
- 2022-02-10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112KB
- 공급사
- 우리전자책
- 지원기기
- PC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책소개
말보다 느린 무용한 탈것에서
최신 기술을 집약한 로망의 산물이 되기까지.
일상의 한 축이자 삶의 동반자인 자동차는 어떻게 디자인되었는가?
세련되고 우아한 자동차 교양인을 위해 자동차 디자인에 얽힌 사연을 소개한다. 기계식 운송수단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던 18세기부터 시기와 목적에 따라 발전을 거듭해온 자동차는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갖추어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아이디어와 시도를 거쳐 왔다. 여기에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오늘날에는 보편화된 이동과 운송 수단의 하나가 된 지 오래다. 실제로 국내에 등록된 자동차는 승용차 수만 세어도 1,900만 대의 선을 넘었다(2020년 통계청 통계 기준). 이 숫자는 그만큼 다양한 디자인의 자동차가 도로 위를 달린다는 뜻이기도 하다. 각이 졌는지 둥그런지, 내재된 성능은 어떻고 브랜드는 또 어떤지에 따라 자동차 디자인은 살펴볼수록 천차만별이다.
다만 어떤 형태의 자동차든 사연 없이 얼렁뚱땅 만들어지지 않는다. 하나하나가 아름다움과 합목적성 사이에서 치열하게 고민한 흔적이며, 기술적 한계와 법적 허용 범위라는 한계 속에서 외줄을 타며 만들어진 지적 노동의 산물이다. 최근에는 환경규제에도 합격해야 하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 한번은 자사의 높은 기술력으로 성능이 좋으면서도 배기가스 배출량과 소음이 적은 차를 만든다고 소개했던 브랜드가 속임수를 쓴 것이 탄로가 나며 명성도 떨어지고 위기를 맞기도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동차는 매력과 안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디자인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물건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954년형 300SL은 빠른 속도라는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차였지만, 레이스카를 큰 수정 없이 일반에게 판매한 결과 수많은 남성의 목숨을 앗아가며 ‘위도우 메이커(과부 제조기)’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었다. 포르쉐 911의 모태가 된 자동차 모델 비틀은 저렴하고 고치기 편하며, 한 가족(부모와 아이 셋)이 탈 수 있는 빠른 차를 생산하라는 히틀러의 지시로 제작되었는데, 그 결과 무게중심을 뒤로 둔 차가 만들어졌다. 스핀 현상이 빈번하고 커브 길에서 사고가 날 위험이 높아 가족을 위한 차로 적절하다고 생각하기는 힘들다.
그 밖에도 성능과 품질이 형편없다는 후기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랑받는 독특한 모델 드로리언, 자신감을 주는 은신처이자 최근에는 어반 정글(Urban Jungle)에서 강점을 보여주고 있는 SUV 모델들, 현실적인 논리와 기술을 바탕으로 스포츠 마케팅의 상징성이 합세해 성공한 모델 미니 등 자동차 디자인의 역사에서 특유의 흐름을 관찰할 수 있는 사례를 책에 담았다. 사연을 알면 왜곡된 정보와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여기에 소개된 사례는 자동차 디자인을 허울만 좋은 겉모습이나 맹목적인 숫자를 벗으나 진중하게 바라보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2차 대전 이후 자동차는 운송수단이라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 개인의 취향과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하나의 상품으로 자리 잡으며 여러 형태로 생산되었다. 비록 그 다양성만큼 수많은 디자인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일부는 오늘날까지 이어져 스타일의 한 축이 되었으며 때로는 과감한 시도를 통해 미래의 디자인을 앞서 선보이고 있다. 이러한 디자인 사례를 모아 살펴보는 일은 오늘날 자동차 형태의 기원을 만나는 흥미로운 여행이자, 아쉬움을 남기는 디자인에 대한 반성일 것이며, 앞으로의 자동차 디자인과 산업의 변화를 내다보는 통찰력을 선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