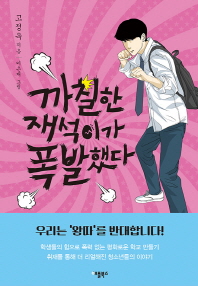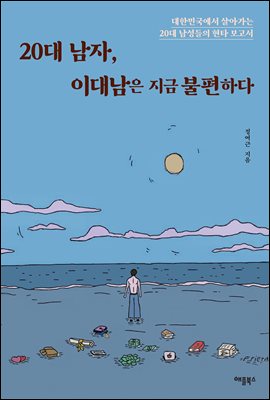서른, 덜컥 집을 사 버렸습니다 - 입사 6년 차 90년생의 좌충우돌 내 집 마련기
- 저자
- 유환기
- 출판사
- 애플북스
- 출판일
- 2022-09-19
- 등록일
- 2023-01-04
- 파일포맷
- COMIC
- 파일크기
- 2KB
- 공급사
- 우리전자책
- 지원기기
- PC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책소개
달팽이가 부럽다는 세대가 말하는 집이란 공간
집을 살 수 없다.
가격이 너무 올라 살 수 없다.
월급이 오르는 것보다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빨라 살 수가 없다.
덩달아 오른 전세금에 신혼집을 마련할 수가 없어
결혼을 미루는 경우도 허다하다.
금수저가 아니고서야 서울 시내에 집 한 칸
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우리는 그런 세대다.
날 때부터 집을 이고 사는 달팽이가 부러워질 때가 있다는 세대.
한때 워런 버핏과 빌 게이츠를 꿈꾸던 민달팽이들의 장래 희망은
이제 서울에 자가 있는 김 부장이다.
-프롤로그 중에서
이 책은 ‘이러다 영영 세입자 신세를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을 느낀 저자가, 어느 날 단호하게 세입자 신세를 청산하고, 생애 최초의 자가 마련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여정을 담은 책이다.
저자는 입사 6년 차의 평범한 직장남.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며 똘똘한 재테크로 착실히 돈을 모으곤 있지만, 사회 통념상 집을 사기엔 한참 이른 90년생이다. 아직 결혼 계획도 없는 그가 대출을 안고 집을 살 결심을 했을 때 가족과 주변의 우려가 적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는 결국 집을 사기에 이른다. 저자는 왜 이렇게까지 ‘과감한’ 결정을 하게 된 걸까?
이제 막 서른을 넘긴 저자는 어느 날 인터넷에서 ‘벼락거지’라는 단어를 접하고 충격을 받았다. 몇 년 동안 이어진 비정상적인 부동산값 폭등 때문에 성실히 살아온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게으르고 머리 나쁜 거지’로 전락했다며 자조적으로 쓰는 말인데 저자는 재치 있는 작명 센스에 잠시 감탄하다가 이내 씁쓸해지고 만다. 그 정의 대로라면 자신 역시 ‘벼락거지’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필자는 서른이라는 ‘새파란’ 나이에 부동산 시장에 뛰어든다. 손품만 팔던 게으른 자세를 고쳐먹고, 열심히 공부하고 분석한다. 그리고 꽤 괜찮은 매물도 날려 보내는 시행착오 끝에 드디어 경기도 지역의 구축 아파트를 매수한다. 이 책은 그 과정에서 필자가 겪은 현실적인 고민과 집을 매수하기까지의 구체적인 절차, 그 과정에 꼭 필요한 정보와 시행착오들을 꼼꼼하게 기록한 에세이다.
필자가 어떻게 집을 살 결심까지 하게 됐는지, 집을 살 때 세운 기준과 원칙은 무엇인지, 생애 처음으로 해보는 엄청난 도전과 모험 앞에 얼마나 가슴 졸이며 애를 태웠는지를 솔직 담백하게 담아냈다.
이 책의 특징
어느새 집은 ‘사는 곳’이 아니라 ‘사는 것’이 되어 버렸다. 기성세대가 잠식한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의 요동 속에, 젊은 세대는 제 한 몸 편히 지낼 보금자리 찾기도 쉽지 않다. 아무리 성실히 일하고 돈을 모아도 치솟는 집값을 따라갈 수가 없어서, 신혼집을 마련하지 못해 결혼을 미루는 커플도 부지기수다. 그렇게 집을 산다는 건 쉽게 내릴 수 없는 결정이고 요즘처럼 계속 금리가 오른다는 말에 걱정이 말할 수 없이 커지지만 설령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또 사람들이 자신을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한탕주의 영끌족으로 매도하더라도 저자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기로 다짐한다. 오히려 ‘집이라는 공간에는 호가와 실거래가 같은 숫자로 정의할 수 없는 의미와 추억과 바람이 담겨 있다’며 유쾌하게 그 모든 파고를 넘을 힘을 집이라는 안식처로부터 얻는다.
그렇게 저자는 누구에게도 허락받지 않고 눈치 보지 않으며 내키는 대로 살아도 좋은 ‘마이 홈’에서,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임을 매일 증명하며 살고 있다. 좋은 집이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기에, 이 만만치 않은 ‘내 집 찾아 삼만리’라는 여정의 끝은 그래서 해피엔딩이다.
핵공감 부르는 책 속 문장들
내 집을 찾기까지 손품을 판다며 광클하던 손으로, 아파트 임장을 돌다 이마에 흐른 땀을 닦던 손으로, 매매계약서에 기어코 도장을 찍은 그 손으로 꾹꾹 눌러 쓴 90년생의 좌충우돌 첫 집 마련기는 한마디 한마디가 “아!” 하며 가슴을 치고 공감하게 한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한다.’
새 주인은 동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매년 5%씩 집세를 올리겠다고 공지했다. 매년 5% 상승은 세입자들에게 거저라는 식으로 말했지만, 보증금 1억 7천의 5%면 850만 원이다. 연봉의 15% 남짓한 금액으로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다. 그게 복리 수준으로 계속 돌아간다고 생각하니 아찔했다. 6개월 뒤에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다른 데로 이사 가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일단 울며 겨자 먹기로 신규 계약서에 서명했다.
‘집. 집을 사고 싶다. 집을 사야 한다.’
그런데 살 수가 없다. 알뜰살뜰 잘해봐야 1년에 2천만 원을 모을 수 있는데 그새 집은 또 1억이 올라 있다. 내 돈이 불어나는 속도보다 집값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 그리고 새삼 다시 한번 자각했다. 좋은 직장을 구해 괜찮은 연봉을 받아가며 나름 잘하고 있다 믿었던 재테크는 솟구치는 집값에 비하면 돼지저금통 속에 모인 동전처럼 짤짤이 재테크였음을.
‘백번은 흔들려야 집주인이 되나 보다.’
내가 떠나보낸 매물은 한 달 새 5천만 원이 오르더니 석 달이 지나자 무려 1억 가까이 올랐다. 무슨 게임도 아니고. 아무튼 마시면서 배우는 술자리 게임처럼 놓치면서 배우는 것이 있었다. 고민은 빠르게, 계약금은 속전속결로. 기회가 왔을 때 준비를 시작하면 늦다. 기회란 걸 알았을 때 후딱 낚아채야 한다. 시장과 매도자는 우릴 하염없이 기다려 주지 않으니까.
‘결국 빚도 자산이라’
이자만 1억이 넘는 막대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것이 정녕 옳은지 고민할 때만 해도 걱정이 몹시 컸다. 그렇다고 사지 않는 경우를 가정해 봐도 걱정되기는 마찬가지였다. (...) 막상 저지르고 나니 이상하게 편안했다. 태풍의 눈 속에 도달한 것인지 아니면 이미 이렇게 된 마당에 뭘 어쩌겠냐는 마음인진 몰라도. 헐렁해진 통장만큼 든든해진 마음이랄까? 내년의 나와 내후년의 나, 그리고 2030년의 나에다 2051년까지의 나까지 힘을 합하면 충분히 갚아낼 수 있는 돈이다! 결국 빚도 자산이니라. 나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않는다. 전혀…. …그렇지?
‘그렇게 세대주가 되는 것이다.’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고 크게 심호흡했다. 다 끝났다. 수억의 돈이 오가는 큰 거래가 있었고, 몇 달간의 사투 끝에 드디어 집을 마련했다. 실감이 나지 않았지만 법적으로 내 집이 생긴 날이었다. 그리고 배가 고팠다. 엄청나게 고팠다.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었다. 하루 세끼를 착실히 챙겨 먹고 간식까지 놓치지 않는 내가 물 한 잔 마시지 않았을 정도로 긴장했던 거다. 큰일이 잘 마무리됐고 긴장도 풀렸으니 이제 먹을 수 있었다. 근처 맛집을 검색하다가 다시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었다. ‘우리 동네 한번 둘러보면서 걷다가 당기는 식당이 있으면 들어가야지.’ 폭풍 같은 허기 속에서 어떤 뿌듯함이 느껴졌다. 마치 밤새워 공부하고 치른 시험이 무사히 끝난 후 기지개 한번 쭉 켜고 집으로 향하는 기분 같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