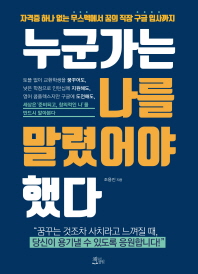나 하나만 참으면 괜찮을 줄 알았어
- 저자
- 이승주
- 출판사
- 책들의정원
- 출판일
- 2019-09-05
- 등록일
- 2020-02-07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0
- 공급사
- 교보문고
- 지원기기
- PC PHONE TABLET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책소개
집에서 살림하면 ‘남편 돈이나 쓰는 밥충이’
회사로 출근하면 ‘어차피 떠날 애 엄마’
“도대체 나보고 어쩌라고?”
여기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 여자가 있다. 딸 하나, 아들 하나, 토끼 같이 귀여운 아이들에 아주 듬직해 보이는 남편까지 ‘스마일’ 미소를 짓고 있다. 게다가 그 여자에겐 번듯한 직장도 있다. 유명하진 않지만 밥벌이치고는 꽤 괜찮다 쳐주는 곳이다. 아직 싱글이거나, 자녀가 없거나, 전업주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넌 정말 다 가졌어. 인생의 숙제를 모두 해결했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어?” 하지만 그들은 모른다. 어떤 스릴러물은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웃음’이 전주가 된다는 사실을! (프롤로그 중에서)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그랬던가. 《나 하나만 참으면 괜찮을 줄 알았어》를 쓴 이승주 작가의 삶도 그러했다. 평탄한 학창시절을 거쳐 남들이 이름 알만한 기업에 들어가 성실한 남편과 결혼생활을 시작했다. 모든 것은 순조로웠다. 하지만 아무런 갈등도 없는 생활이란 결국 누군가의 인내로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그리고 언제나 참는 사람은 ‘나’였다. 아내이자 엄마, 그리고 며느리라는 이유로.
어릴 때는 부모님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참았다. 공무원이 되거나 대기업에 들어가 부모님에게 인정받고 싶었고 나의 꿈은 뒤로 미뤄두었다. 결혼해서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 참았다. 출산 휴가 중, 아이를 낳느라 지친 몸을 눕히고 있으면 남편에게 “거, 집도 치우고 아침밥 좀 챙기지?”라는 말을 들었다. 남편은 배울 만큼 배운 교양 있는 사람으로 주위에서는 ‘자상한 남자’라는 칭찬을 듣곤 했다. 하지만 이런 평가를 들을 때면 어쩐지 심술이 났다.
한번은 친정아버지가 시부모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고 오셨다. “아리 아빠를 부를 때, 이름 말고 김 서방이라고 불러달라더라.” 그 이후로 아버지는 남편을 꼬박꼬박 “김 서방”이라고 호칭하셨는데, 이는 정말이지 약 오르는 일이었다. 시댁에서는 “새아가”라거나 “○○아”라는 말 대신 “너”로 통일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너’인데 어째서 당신은 ‘김 서방’인 거지?”
그러나 집에서 새는 ‘호구’는 밖에서도 ‘호구’였다. 회사에서는 “어차피 곧 떠날 애 엄마잖아”라며 승진 목록의 가장 뒷줄로 밀려났고, 아이들을 데리고 집밖에라도 나가는 날이면 “팔자 좋은 아줌마가 애들 데리고 커피 마신다”며 비아냥거리는 말을 들어야 했다. 참을 인(忍) 자 셋이면 살인도 피한다고 했고,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도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묵혀놓은 감정은 언젠가 반드시 터질 시한폭탄이 될 뿐이었다.
엄마로서, 며느리로서, 워킹맘으로서 겪어야 했던 모든 ‘불편한 순간’들을 그저 지나치지 않기 위해 이승주 작가는 스스로 ‘불편러(불평하는 사람)’가 되기로 했다. 《나 하나만 참으면 괜찮을 줄 알았어》에서 때로는 시원한 욕설로 세상을 고발하고, 때로는 가족에게도 꺼내지 못한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솔직하다 못해 ‘신도림역 안에서 스트립쇼’를 벌이는 심정으로 글을 썼다고 말하는 작가는 “착한 척하지 않고 꺼내는 이 이야기가 나, 그리고 나와 비슷한 당신의 삶을 바꿀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한다. 꼴 보기 싫은 사람 떼어놓는 법, 시댁의 언어폭력에 대처하는 법, 아이들만 챙기느라 뒷전인 내 자신을 돌보는 법 등 작가가 생활 속에서 실천해온 방법들을 통해 이제는 참지 않고 살아갈 용기와 지혜를 얻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