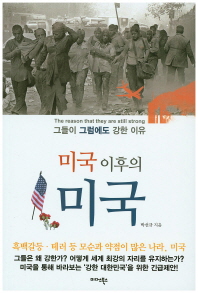전쟁 25시 - 걸프전, 소말리아, 수단, 유고까지 종군기자 박선규의 생생한 현장 취재기
- 저자
- 박선규
- 출판사
- 미다스북스
- 출판일
- 2021-11-16
- 등록일
- 2021-11-25
- 파일포맷
- COMIC
- 파일크기
- 6KB
- 공급사
- 우리전자책
- 지원기기
- PC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책소개
“지도자가 실패하면 나라가 불행해지고
나라가 불행해지면 국민은 비참해진다.”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엔
지위고하의 차이도, 빈부귀천의 구별도 없었다.”
그리고 2021년, 나는 깨달았다.
“내가 사는 지금 이 세상이 전쟁터였다!”
『전쟁 25시』는 국내 최초로 발간되는 종군기자의 전쟁 취재기이다. 20여 년간 기자로 살았고 그동안 네 차례 종군기자로 전쟁터를 오간 저자의 취재기록을 엮은 것이다. KBS에 입사해 3년차쯤 되었을 때 걸프전 종군기자로 자원했다. ‘기자라면 종군 한번쯤은 해봐야지.’라는 호기로 시작한 종군 여정은 소말리아, 수단, 유고까지로 이어졌다. 그는 삶의 터전이 전쟁터로 변한 모습, 변해가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저널리스트의 눈으로 보고 듣고 기록했다.
각기 다른 전쟁터 4곳의 상황을 생생하게 기록한 이 책에는 전쟁의 참혹성과 사람들의 비극적인 삶은 물론 종군기자로서의 인간적 고뇌가 함께 담겨있다. 또 당시의 상황을 통해 자연스럽게 오늘의 우리를 돌아보도록 하는 미덕도 품고 있다.
누군가는 물을지도 모르겠다. 갑자기 웬 느닷없는 전쟁 이야기냐고. 이 시점에 20년도 더 된 옛날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저자는 고백한다.
“깨달음이 있었다. 어느 순간 돌아보니 내가 사는 지금 세상이 전쟁터였다.”
이슈가 생길 때마다 무섭게 편이 갈려 상대를 모질게 공격하는 사람들, 우리편은 무조건 옳고 상대편은 무조건 잘못됐다며 핏대를 세우는 사람들, 단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혈연도 우정도 돈독했던 과거도 다 팽개치고 이기는 데만 혈안이 된 사람들, 서로에게 더 큰 상처를 주기 위해 ‘자극’을 독려하고 ‘독함’을 경쟁하는 위험한 사람들, 무자비한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무모한 사람들, 또 그들의 선두에서 싸움을 독려하며 깃발을 치켜드는 사이비 지도자들… 그건 분명 전쟁이었다. 전쟁 가운데서도 가장 치명적인 내전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총칼의 자리를 말과 글이 대신했을 뿐.
‘여기서 더 가면 안 되는데... 한 걸음만 더 나가면 치명적인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 걱정이 책을 쓰게 했다. 그는 『전쟁 25시』가 사람들에게 오늘을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는 계기를 제공하면 좋겠다고 말한다. 너무도 쉽게 전쟁을 얘기하고 너무도 가볍게 전쟁위협을 대하는 우리 사회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주변을 살피는 기회가 된다면 정말 좋겠다고 희망한다.
참혹한 전쟁터, 승자와 패자의 구분도 없는…
그곳에는 모두 패자들뿐이었다
“그들은 전쟁 전의 세상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목숨을 걸고라도 다른 삶을 살겠다고 했다.”
전쟁터에는 철저하게 본능에 충실한 인간본연의 모습만 남아 있다. 오로지 생존만을 생각하는 사람들, 살아남기 위해 모든 것을 견뎌내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이 전쟁터였다. 지위고하의 차이도 빈부귀천의 구별도 없다. 모두 다 내일을 기약하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들일 뿐이다. 그저 살아있음에 감격하고 다치지 않음에 감사하고 끼니를 때울 수 있음에 만족하는 본능적 모습들뿐이다.
그리고 그런 그들의 모습이 저자에게 자신을 돌아보게 했다고 말한다.
“그들을 보며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엄청난 기적인지 깨달을 수 있었다. 평상시 걸치고 사는 온갖 귀한 것들이, 대단한 간판과 타이틀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깨달을 수 있었다. 그것은 관성적인 삶에 빠져 있던 나를 깨우는 죽비였다.”
그래서 별다른 문제의식도 두려움도 없이 전쟁과 가까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 전쟁의 실상이 어떤 것인지, 그 속에서 사람들은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또 그들의 미래는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저널리스트로서의 관찰을 바탕으로 한 취재과정에서 저자는 ‘모든 전쟁의 배경에는 지도자의 실패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또한 ‘전쟁은 패자는 물론 승자까지도, 그 지경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처절한 패배자로 만드는 상상초월의 괴물이었다’고 강조했다.
적어도 내전의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에겐 승자와 패자의 구분이 없었다. 그들은 모두가 패자였다. 그들 스스로의 평가도 다르지 않았다. 그런 비극이 빚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었다고 했다. 사랑했던 사람들이 죽고 기댔던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에 이겼다는 게 무슨 의미냐고 반문했다. 그들의 얼굴엔 살아남았다는 기쁨보다 고통의 시간이 안겨준 무거운 그림자가 더 짙고 강했다. ‘전쟁 전의 세상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목숨을 걸고라도 다른 삶을 살겠다’는 전쟁터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안타까운 목소리도 전한다.
저자는 전쟁터를 벗어난 지 25년이 지났지만 종종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고 말한다. 다시 종군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 전쟁터에서 봤던 것들과 유사한 모습들이 너무 많다고 한다. 그게 걱정이 됐고 그 걱정이 책을 쓰게 했다고 한다. 이 책을 통해 사람들이 전쟁에 대해 한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면 좋겠다는 것이 저자의 바램이다. 너무도 쉽게 전쟁을 얘기하고 너무도 가볍게 전쟁위협을 대하는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스스로를 돌아보고 주변을 살피는 기회가 된다면 정말 좋겠다는 것이다.
저자는 종군했던 각각의 전쟁의 성격과 거기서 얻은 교훈을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걸프전 (1991. 2. 5 ~ 3. 18)
미국의 힘, 대한민국의 왜소함을 확인한 전쟁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잔인한 탐욕과 무자비한 힘의 논리였다!”
소말리아·수단 내전 (1992. 12. 10 ~ 12. 31)
뿌리깊은 냉전의 상처, 지도자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전쟁
“지도자의 무능과 탐욕이 부른 지옥, 무정부는 독재보다 훨씬 위험했다!”
유고 내전 1 (1993. 2. 10 ~ 3. 11)
이념의 위험성, ‘민족’이란 말의 의미를 돌아보게 한 전쟁
“맹목적 이념에 중독된 군중에겐 가족도 친구도 짓밟아야 할 적이었다!”
유고 내전 2 (1995. 1. 20 ~ 1.31)
결국 전쟁의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임을 확인시켜준 전쟁
“내전의 끝은 평화가 아니라
더 크고 깊어진 상처를 견뎌야 하는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이었다!”